 이슬람국가(IS)에 관한 뉴스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반군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고 있다. 이들은 두 나라 국경지대의 상당한 영토를 확보한 채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슬람국가(IS)에 관한 뉴스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반군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고 있다. 이들은 두 나라 국경지대의 상당한 영토를 확보한 채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서방의 무고한 인질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방의 몇몇 나라에선 거기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이들이 내걸고 있는 하나의 이슬람 국가라는 이념이 헛된 환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합류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지 궁금해진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기에 반드시 큰 환멸이 따를 것임은 분명하다. 누군가가 그냥 환멸에 그치지 않고 그 전쟁의 속살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참상을 낳았는지를 세상에 알려준다면, 추상적인 역사책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또 하나의 소중한 기록물이 될 것이다. 스페인 내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1930년대 스페인은 공화정을 선포하고 토지개혁을 포함한 몇 가지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유럽과 미국의 피 끓는 젊은이들이 파시스트 타도라는 명분아래 속속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 중의 하나가 바로 영국의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다.

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던 시도가 무산되어 절망하고 있던 차에 스페인 내전은 이들에게 그들의 신념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공했다. 그들로 하여금 남의 나라 전쟁에 자발적으로 모여들게 한 것은 오로지 압제와 불평등과 착취를 종식시키고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 신념의 실천에 대한 기록이 바로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Homage to Catalonia)>다.
이 작품은 193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오웰이 직접 참전한 스페인 내전의 기록이다. 그것은 전쟁을 멀찍이서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모두 그 자신이 직접 겪은 고통스런 경험을 따스한 유머로 쓴 기록이다.
오웰이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카탈로니아 지역은 이미 사회주의의 기운이 그 절정을 약간 넘긴 후였다. 그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리’ 같은 존칭을 버리고 ‘동무’란 말을 쓰고 있었고 온갖 것들이 이미 ‘집산화’돼 있었다. 그야말로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실현될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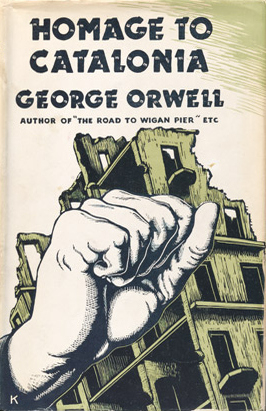 당시 반파시스트 진영에는 온갖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오웰은 우연히도 마르크스주의 통일 노동자당(POUM) 소속의 의용군에 배속됐다. 그는 군사 훈련이랄 것도 없는 엉성한 훈련을 받은 후 낡고 녹슬어 제대로 발사되지도 않는 총을 들고 곧바로 사라고사의 전선으로 배치됐다.
당시 반파시스트 진영에는 온갖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오웰은 우연히도 마르크스주의 통일 노동자당(POUM) 소속의 의용군에 배속됐다. 그는 군사 훈련이랄 것도 없는 엉성한 훈련을 받은 후 낡고 녹슬어 제대로 발사되지도 않는 총을 들고 곧바로 사라고사의 전선으로 배치됐다.
그곳의 생활은 400여 미터 높이 산 능선의 한 쪽에 파놓은 참호에서 건너편 능선에 있는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대와 대치하는 것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적군이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는 역할이었다. 그러니 화끈한 전투 같은 것은 없고 참호 속에서 죽치고 기다리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찬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오는 한 겨울 산 능선의 참호 생활은 지옥보다 더 고약했다. 수시로 총알이 날아오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배설하는 생활은 괴로움 그 자체였다. 우리는 흔히 전쟁의 냄새하면 화약 냄새를 연상하기 마련이지만, 오웰이 겪은 전쟁은 똥오줌 냄새와 아무리 잡아도 없어지지 않는 이와 밤이면 사람을 짓밟고 기어 다니는 쥐,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지루함이었다. 담배라도 피우면 그 지루함을 다소 달래보겠지만, 먹을 물도 없는 곳에 그런 것이 공급될 리 없었다.
몇 달 동안 그런 생활을 한 후 드디어 휴가를 얻어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보니 그곳은 변해도 너무 변해 있었다. 전선을 호도하는 정치적 선전도구가 된 신문기사만을 믿고 사람들은 전선의 참상 따위는 아주 잊은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진영이 휩쓸린 아군과의 시가전 때문에 건물 지붕위에서 며칠을 굶주리며 지내야만 했다.
차라리 전선이 더 나았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피아가 분명했고 묵묵히 자신들의 신념을 실천하는 전우들의 인간적인 따스함이 있었다. 그러나 전선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저격수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후송된다. 부상을 치료한 직후 그는 밤기차를 타고 가까스로 그곳을 탈출한다.
모두가 단결하여 파시스트 군대와 싸웠어도 이겼을지 의심스런 싸움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아군을 적으로 몰아 죽이는 권력싸움이 벌어졌으니 그 전쟁의 결말은 빤한 것이었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군에 있던 사람들은 전선을 지키다 하나씩 죽어갔다.
그들의 고결함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웰은 이 책을 썼다. 오웰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오늘날도 그의 작품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다. 신념을 따라 사는 것, 그걸 기록으로 남겨 후세로 하여금 삶의 지표로 삼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



